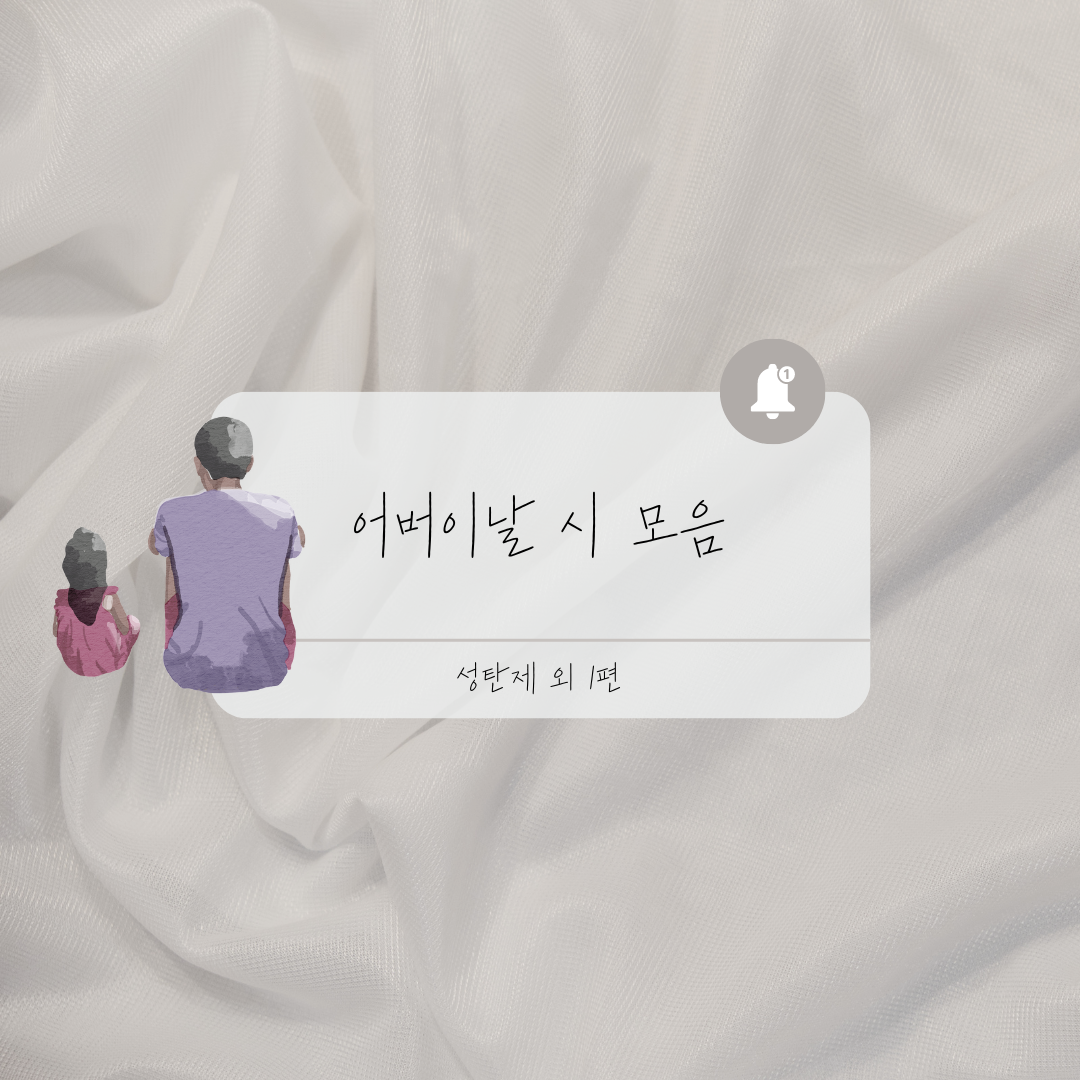
성탄제
김종길
어두운 방 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藥)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그 붉은 산수유(山茱萸) 열매ㅡ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熱)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聖誕祭)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血液)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못 위의 잠
나희덕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체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 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 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하나, 그 위의 잠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 탈모가 생기셨습니다. 스트레스성 탈모라는 진단을 시작으로 동그란 모양이 가마 주위부터 넓어지더니, 그대로 머리가 희끗해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반에서 몇 되지 않는 급식비 미납 학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저라도 염치가 있는지라, 앞에 나가 미납된 고지서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받기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으려 할수록 그 자체를 신경 쓰게 돼 늘 괴로움이 제 고교 생활을 따라다녔지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이 일을 두곤 어머니께선 늘 아버지와 다투셨습니다. 그까짓 공과금 하나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이냐며 따지고 들기 일쑤였고,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만도 쉽게 아물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다툼 속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은 어릴 적 굳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경계에 놓인 학생이었습니다. 사랑 받기에는 조금 민망스러운 구석이 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의 불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들과는 내가 다르다는,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르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알게 되었던 듯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괜스레 더 혼란스럽고 마음이 바빠져서, 예민하게 다른 사람들을 가시로 찔러 내 주위를 떠나게 한 듯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 내 영글지 못한 판단 능력으로 아버지의 그 고된 세월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늘 퇴근길에 무거운 구둣발을 경쾌한 걸음으로 바꾸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구둣발 소리에 쫑긋하며 저녁이 되면 아버지를 기다리는 낭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살림에서도 아버지는 늘 웃으시며 동큐 치킨 한 마리를 손에 쥐고 현관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반가워한 것인지, 치킨 한 마리를 반가워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늘 아버지의 발걸음이 기대되었었지요.
나희덕의 시에서 아버지는 제비와 같은 존재라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못 위에서 어려운 잠을 자고 있지만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외로움을 감내해 내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외로움을 감내해 내면서도, 당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힘겨움을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쉼마저 '못 위'라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못 위로 내몰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외로움에, 책임감까지도 덧칠해 살아가야하는 현대 사회의 아버지. 그들이 못 위에서 꿈꾸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어버이날이 되어 함께 못 위에서 고민해 보려 합니다.
어머니 시, 어버이날 시 모음 (김초혜, 고정희, 김윤도)
어머니 김초혜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뉘일 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 몸
kowriter30.com
바다가, 허수경 (바다 시, 사랑 시)
바다가 허수경 깊은 바다가 걸어왔네 나는 바다를 맞아 가득 잡으려 하네 손이 없네 손을 어디엔가 두고 왔네 그 어디인가, 아는 사람 집에 두고 왔네 손이 없어서 잡지 못하고 울려고 하네 눈이
kowriter30.com
진달래꽃, 김소월 (이별 시, 아름다운 시)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
kowriter30.com
'시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시, 윤동주 (내면 고백 시, 성찰 시) (0) | 2023.05.09 |
|---|---|
| 바다가, 허수경 (바다 시, 사랑 시) (0) | 2023.05.08 |
| 자화상, 윤동주 (성찰 시, 일제강점기 시) (0) | 2023.05.05 |
| 침묵, 이해인 (언어 시, 사랑 시) (0) | 2023.05.02 |
| 신경림 시 모음 (가난한 사랑 노래 외 2편) (0) | 2023.04.30 |




댓글